서홍석 展
SEO, HONG SEOK Solo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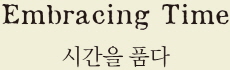

축복_70x100cm_아크릴, 혼합재료 on Fabriano, Pittura Paper_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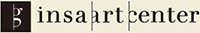
인사아트센터
2020. 4. 22(수) ▶ 2020. 4. 28(화)
Free Opening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1-1, 6층 | T.02-736-1020

봄의 전령_70x100cm_아크릴, 혼합재료 on Fabriano, Pittura Paper_2019
엉킴과 풀림의 신화
-서홍석의 회화
푸르고 어둑한 그늘 속에서 꽃들, 들풀들, 덤불이나 그루터기들, 그리고 잔가지에 남아있는 열매들이 어슴푸레하게, 그러나 또렷이 떠오른다. 거기에 첩첩하게 서려 있는 보이지 않는 서사들은 지난 삶의 흔적들이 씨줄과 날줄로 엉켜 있는 시간의 타래들이다. 날것으로 아우성치는 이 응어리들을 무어라 이름하여야 마땅할까? 쉬이 호명할 수 없는 지난 삶의 어혈들인 그것들은 무수한 시간의 잠재적 무의식으로 되살아난다. 거기에 깃들어 있는 서사들은 화가 서홍석의 끈질긴 붓질이 더듬어 찾아낸 세계의 숨은 기억들이다. 이 기억들은 화가의 삶에서 길어 올린 한낱 개인적 서사와 우리 사회의 집단적 서사 사이를 폭넓게 오가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것은 붓 자국마다 스며 있는 화가가 숱하게 겪은 고단한 경험들이 동시대를 함께 해온 사람들 공통의 기억과 만나 수많은 풀림으로 되살아나는 신화와 같다. 그가 붓으로 풀어내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일상적인 모습들은 우리 사회가 잊고 있던 하나하나의 신화로서 다가온다.
역사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동시에 현재를 들여다보는 창구로서의 열린 이미지와 같다.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에 따르면 열린 이미지는 고정된 세계와 존재를 허물어내고 그 갈라진 틈을 통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미지는 단순한 모사 이상의 것을 담고 있는 잠재성의 세계이다. 따라서, 서홍석이 자신이 겪어온 삶의 뒤안길에 남겨진 사물들을 뛰어난 묘사력으로 때로는 아름답게, 때로는 우울하게 포착해내고 있지만, 정작 그가 보여주려는 것은 오히려 그것들이 감추고 있는 속살이자 그 안쪽에 있는 기억의 내밀한 풍경이다.
이처럼, 그가 묘사한 이미지는 언제나 안팎으로 열려 있는 창문으로서 빛바랜 기억을 환기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가시성(可視性)의 이미지이다. 그가 소환하는 우리의 삶에서 친숙하고도 무심히 보아 넘겨온 대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속절없는 시간의 흐름에 잠시 휴지부를 두고 지나온 날들을 다시 마주하게 한다. 서홍석의 그림들은 화가가 살아온 삶의 주변부에서 일상으로 마주치는 들풀이나 들꽃 등의 이 땅에 숨쉬는 사소한 대상들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들은 화가의 끈질긴 시선을 고스란히 간직했다가 어느 순간 보다 더 무르익은 이미지로서 거울처럼 자신을 되돌려준다. 그러한 이미지는 외양 그대로의 닫힌 세계가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을 지나간 시간 속으로 끌어들여 현재의 시간과 관계를 맺어주는 매개물이다. 따라서, 그의 그림들은 동시대를 겪어온 사람들을 간절하게 ‘바라본다’. 그것은 벤야민(Walter Benjamin)이 말한 신천사(新天使), ‘앙겔루스 노부스(Angelus novus)’처럼 미래로 떠밀려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불어오는 시간의 바람에 자꾸만 뒤로 떠밀려 가면서, 그 뒤쪽에 불안한 눈길을 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발아래 쌓여가는 지난 시간의 수많은 잔해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것은 현재와 상관관계에 있는 과거로서의 역사의 잔해들이다. 벤야민에 따르면 역사는 그것들을 끝까지 응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새로운 천사’의 시선이다.

일기(日記)-낯선 꿈_50x70cm_아크릴, 혼합재료 on Fabriano, Pittura Paper_2019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모든 사물의 잔영들은 그가 절실하게 현재로서 바라보았던 응시의 강도만큼 그와 관계해온 시간들이다. 그것은 그가 늘 현재시제로서 마주해온 당대의 시간이자 예술가의 예민한 시선으로 겪어온 사회적 공간과 긴밀한 상호관계를 맺는 삶의 흔적들이다. 그것 자체로는 그저 무심할 뿐인 사물들은 화가의 집요한 붓끝에서 단순한 재현 이상의 시간의 현현(顯現)으로 되살아난다. 그렇게 그가 그려낸 회화는 그가 즐겨 되새기는 마크 로스코(Mark Rothko)의 말처럼 “경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험 그 자체이다”. 그에게 경험은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경험이지만 동시대를 겪어온 감지기로서의 예술가의 지난 시간에 대한 모든 사회적 경험을 포괄한다. 그러므로 그의 그림은 살아있는 역사이고 숨 쉬는 신화이다.
서홍석이 그려내는 신화로서의 기억을 소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자신을 둘러싼 주변부이자 자신이 지나온 삶의 뒤안길에 대한 기억의 풍경으로서이다. 그것은 먼저 자신이 나고 자란 땅에서 있었던 지난 시간에 대한 각인된 산고의 기록들이고, 다음으로는 그 시간의 연속으로서 현재의 삶이 영위되는 대도시에서 일상으로 마주하는 소외된 현실에 대한 소소한 기록들이다. 그에게 지난 역사는 한때 춘궁기에 우리 선대들의 삶을 버티게 해준 질경이, 민들레, 쑥, 씀바귀, 진달래, 원추리, 패랭이, 목화꽃, 찔레꽃, 쑥부쟁이 등등 여러 들풀에 얽힌 고단했던 시간의 기록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 깃든 그리움과 시련의 시간은 뒷골목을 오가는 서민들의 삶이 마주하는 익명의 대상들과 소시민적 생활을 암시하는 어둠 속에 희미하게 부유하는 사물들을 통해 아스라하게 포착된다. 그는 이러한 사물들을 감광지의 표면에 서서히 떠오르는 이미지처럼 깊고 어두운 배경으로부터 점점 솟아오르는 대상으로 표현한다. 그러한 방식으로 그가 형상화한 이미지들은 지난 시간으로부터 하나씩 소환되어 되살아나는 ‘생성’의 의미를 띠고 있다.
특히 짙은 청록색 계열로 들풀들을 그린 그의 그림에는 한때 우리 사회가 겪어온 어려운 시기의 삶의 두께와 무게가 풀줄기를 묘사하는 붓 자국마다 두텁게 드리워져 있다. 그가 한 포기, 한 포기마다 그러안고 건곤일척의 혈투를 벌이듯이 그려낸 듯한 그 들풀들에는 지난 세월 우리 선대의 끈질긴 삶과 정신의 자취가 오롯이 서려 있다. 그중에 비교적 예외적인 오브제로서 돋보이는 작품은 샹들리에의 이미지이다. 그가 그린 샹들리에는 더러 주말이면 참예하는 친지나 지인들의 예식에서 소시민들의 헛헛한 희망처럼 예식장의 천정에 덩그러니 매달려 있다. 거기에 서려 은은하게 반짝이는 빛은 서둘러 축의금을 내고 나오는 의례적인 분주함 속에 매번 잊히곤 하는 삶의 부재를 말없이 내비치고 있는 듯하다. 그 빛이 비추는 막막한 현재는 대체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먹고사는 문제 만으로도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그래도 어딘가 삶의 혈관에 뜨거운 피가 돌던 지난 시절의 소박한 시간들이 간직한 삶의 온기는 모두 어디로 간 걸까? 침묵의 허공에 쓸쓸하게 매달려 있는 샹들리에는 이 모든 의문을 수수께끼처럼 아련하게 머금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주변의 일상적인 사물이나 정경들을 추적하던 서홍석의 붓이 건져낸 놀라운 존재론적 성과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낯설고 추방된 삶의 실체에 대한 오마쥬와 같다. 거기에서 발하는 침묵의 빛은 동시에 그곳에 의례적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시민들이 지난날 공동체적 의례를 통해 나누었던 끈끈한 유대의 시간을 묵묵히 환기한다.
벤야민을 인용하면서 프랑스의 미학자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Georges Didi-Huberman)은 말했다. “과거가 현재를 비추고 현재가 과거를 비춘다고 말해선 안 된다. 반대로 이미지는 지난날이 지금과 만나 빛을 내는 덩어리이다.” 서홍석의 그림들 또한 지금의 시간 속에 소환된 과거의 역사가 현재 속에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다. 그것은 그가 살아낸 모든 절망과 환희로 엉킨 시간 속에 풀어낸 그만의 신화이자 이 땅에 사는 한국인들 실존의 바탕을 지탱해온 뚜렷한 삶의 지문이다.
서길헌(미술비평, 조형예술학 박사)

일기(日記)-갈망_50x70cm_아크릴, 혼합재료 on Fabriano, Pittura Paper_2019
Myth of Tangled and Untangled
- Paintings of Hongseok Seo
In blue and dark shade dimly but vividly come up flowers, wild herbs, bushes, stumps and fruits left on twigs. Invisible descriptions clouded up in layers there are coils of time from the past tangled with lines of longitude and latitude. What should these shouting, raw lumps be called? These wastes from the past that cannot be easily called return as potential unconsciousness of innumerable time. Descriptions indwelling there are memories of the world traced with pertinacious brush strokes made by artist Hongseok Seo. These memories form a bond of sympathy that widely covers from sole personal descriptions raised from artist’s own life to collective descriptions in our society. It is like a myth brought back as being countlessly untangled through encounter of the artist’s tortuous and exhausting experiences with common memories of contemporaries. Everyday aspects of the world surrounding the artist painted with his own brush comes as myths one by one that our society has forgotten.
History is like an open image as a window to look back to the past and also to look into the present. Umberto Eco stated that an open image tears down a fixed world and existence and shows something through that crack. Thus, image is a world of potential beyond simple mimesis. Though Hongseok Seo captures things left in the mists of time he’s gone through sometimes beautifully or in a depressed way at other times using his exceptional depictive power, what he wants to show us is rather flesh hidden behind them and inner landscape lying inside.
As I have said above, images he depicts are the image of visibility that is ever ready to recall faded memories as a window open both to inside and outside at all times. Objects he recalls that we’ve overlooked both familiarly and indifferently in our lives make people put a short pause in futile flow of time and face the old times. Paintings of Hongseok Seo are merely of small things living on this land like wild herbs or wild flowers that he’s routinely run into on the periphery of his life but they cherish his persistent attention as it is and give themselves back as riper images at some point like a mirror. Those images are not a closed world as it seems but a medium that draws a viewer into times past and links with the current time. Thus, his works heartily ‘gaze’ at contemporaries. It is like ‘Angelus novus (new angel)’ that Walter Benjamin stated – it tries not to be carried to the future but cannot ever avoid it with constantly blowing wind of time, giving an anxious eyes to the back but looking at tons of remains piled up underfoot from the past at the same time. It is remains of history as the past correlated with the present. According to Benjamin, history is eyes of ‘Angelus novus’ that strains to look at them till the end.

일기(日記)-시리즈_50x70cm_아크릴, 혼합재료 on Fabriano, Pittura Paper_2019
Traces of every object in his paintings are times that have been related with him as strongly as he has keenly looked as the present. It is the current time he’s faced as the present tense all the time and traces of life that are closely correlated with social space the artist’s sensitive eyes have gone through. Any object that would simply be indifferent as it stands is revived as manifestation of time beyond mere reproduction at the tip of the artist’s stubborn brush. Paintings he made that way are, as his favorite quote of Mark Rothko, “not about experience but the experience itself.” Experience primarily is personal one to him but it incorporates all of social experiences to the artist’s past as a sensor of contemporary period. Thus, his paintings are living history and breathing myth.
The ways that Hongseok Seo recalls memories as myth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types. The first is as landscape of memories for the periphery of his life and for the mists of time that surround himself. It is records of labor pains imprinted as to the past of land where he was born and raised and the next is minor records about isolated reality that is everywhere in a big city where he leads his current life as sequence of time. To him, history from the past is demonstrated with records of exhausting time intertwined with various wild herbs like plantain, dandelion, mugwort, lettuce, azalea, day lily, pink, cotton flower, multiflora, aster and the like that used to support our ancestors over the spring austerity season. The time of longing and ordeal indwelling in the current life is dimly captured through objects faintly floating in darkness that implies anonymous objects that the ordinary face in back alleys and their lives. Hongseok Seo expresses these objects as emerging from deep and dark background like images slowly coming up on the surface of light-sensitive paper. Images represented in that way mean ‘creation’ called from the past and then revived one by one.
Thickness and weight of life in tough times that our society has once gone through particularly falls over his paintings with wild herbs in dark turquoise tone on every brush mark that depicts stems of grass. He seemed to hold and have a blood fight against every single clump of grass to paint those wild herbs, which solely express traces of our ancestors’ importunateness in life and spirit from the past. Among them, the image of chandelier stands out as a relatively exceptional objet. Chandelier he painted is just hanging from the ceiling of a wedding hall with a ceremony that we occasionally go to on weekends for our relatives or acquaintances like an empty hope of ordinary people. Subdued light shining there appears to silently hint at absence of life that is always forgotten in the midst of ritualistic busyness of hurriedly paying congratulatory money. That desolate reality shone by that light – what would it be and where are we at this moment? People used to be fatigued every single day only for their survival but still had hot blood pumping through their veins – where has all of it gone? The chandelier hanging in silent air indistinctly holds all these questions like enigma. It is amazing ontologistic achievement pulled by the brush of Hongseok Seo who has chased everyday objects or landscapes around him so far. In other words, it is like homage to truth of strange and displaced life that nobody cares. Light of silence shining there dumbly recalls the time of close bond that citizens just formally gathering and then scattering used to share through communal ritual in the past.
Quoting Benjamin, the French aesthete Georges Didi-Huberman stated “We should not say the past shines the present and the present shines the past. Image, on the contrary, is a lump that shines when the past meets the present.” Hongseok Seo’s paintings are also like light that history of the past recalled in the current time brightly shines within the present. It is his own myth untangled in the time tangled with all of despair and joy that he has lived through and a distinct fingerprint that has sustained the foundation of Koreans’ existence on this land.
Gilheon Seo (Art critique, Ph. D. of Formative Art)

전시장 전경

일기(日記) Series-날들의 기억_35x50cm, 42ea_Oil, 혼합재료 on Fabriano, Pittura Paper, Canvas_2018

봉숭아_90x90cm_아크릴, 혼합재료 on Canvas_2007

찔레꽃 열매_90x90cm_아크릴, 혼합재료 on Canvas_2007

비비추 정원_90x90cm_아크릴, 혼합재료 on Canvas_2007
* 전시메일에 등록된 모든 이미지와 글은 작가와 필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
vol.20200422-서홍석 展
